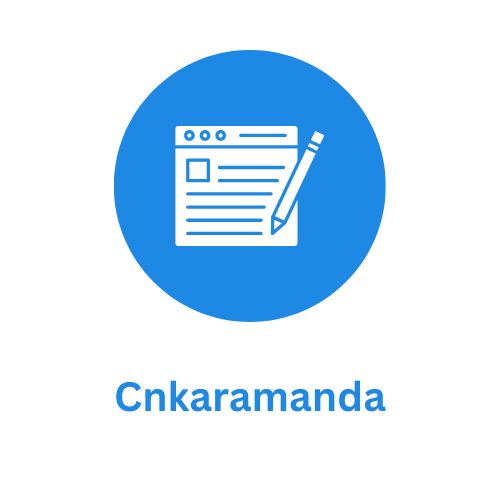2025년 현재, 세계는 다시 한 번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안보·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OpenAI, Google DeepMind, Anthropic 등 굵직한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성능 GPU 생산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NVIDIA가 전체 AI 생태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Baidu, Tencent, Huawei 등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쟁은 단순한 민간 기업 간의 기술 싸움이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AI 기술의 전략적 통제를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국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자체적인 AI 프레임워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국은 AI를 국방 및 정보전 영역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율 무기 시스템, 감시 기술, 사이버전 전략 등은 모두 AI 기술과 결합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통제 수단에 대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또한 AI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노동시장에서 AI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기술 경쟁이 세계적인 디지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기술 후발 국가들은 이 경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경제 격차와 정보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
기술은 국경을 넘는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유엔, OECD, G20 등 국제 기구들은 AI 윤리 기준 마련과 기술 공유,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러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AI 기술 경쟁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철학의 경쟁’이기도 하다. 향후 10년간 인류가 AI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계 질서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